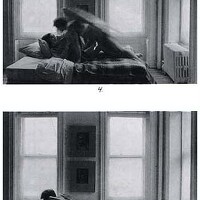사진가, 제주도, 두모악갤러리, 고독한 그러나 행복한 사진가, 루게릭병, 열정, 바람
"떠나는 사람들은 떠난 뒤에 가끔 섬을 그리워하지만, 섬에 남아 잇는 사람들은 단조로운 생활에 사람이 늘 그립다. 늘 혼자인 나도 외로울 때가 있다. 육지에서 온 손님이 떠난 뒤에는 한동안 사람을 그리워하며 산다. 바쁜 도회지 사람들은 그럴 여유가 없겠지만, 한가롭게 지내는 나는 손님들과 함께 즐거웠던 순간들이 한동안 정신을 혼미하게 하여 정처 없이 떠돌곤 한다." p149
"마라도에 가면 세상이 보인다. 작은 섬 안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 종교, 철학, 문학, 회화, 음악, 무용이 모두 다 있다. 갯바위 파도는 시를 읽어주고 바람은 잠시도 쉬지 않고 노래하며, 억새는 춤추고 하늘과 바다는 그림을 그린다. 수평선은 고독과 자유를 강의하고 구름은 삶의 허무를 보여준다." p152
"미친 사람은 행복하다" 무엇에든지 미쳐서 산다는 건 행복한 일이다. 나에게 미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인가. 책을 읽으면서 되뇌어 보인다. 모든 것들을 놓아버린 채 미쳐버릴 수 있는 일이란게 무엇일까. 여러 가지 뒤엉킨 생각들이 떠오르긴 하지만 어느 하나 정리하고 고민할 만한 것이 없다. 너무 큰 걸 기대하고 바라기 때문이라 자위해 보지만 적절한 변명은 되지 못한다. 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훌훌 털어버리고 배낭하나 메고 여행을 가고 싶다. 카메라와 함께라도 좋고 아니면 빈손이라도 좋다. 개울물이 졸졸 흐르는 계곡에 햇빛에 잘 달구어진 바위위에 기대 앉아 책이라도 읽고 싶다. 하지만 난 손에 쥐고 있는게 아직 너무 많은가 보다. 손을 꽉 움켜지고 그 어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보다. 욕심이 많으니 버리지 못하나 보다.
김영갑은 바람 같은 사람이다. 바람과 함께 하고 바람처럼 살다 간 사람이다. 제주도가 그를 불렀고, 그 역시 섬 사람이 되지 못했지만 그는 그 속에서 바람이 되었다. 지금도 바람이 되어 제주 어딘가를 흘러 다닐 것이다. 그가 찍은 사진에는 바람이 보인다. 그 자신이 바람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난 그의 사진에서 풍경이 아닌을 바람을 읽는다. 다시 제주도를 찾는다면 난 바람을 볼 것이다. 바람에 날리는 억새나 나뭇잎이 아니라 바람 자체를 보려 할 것이다. 그 속에서 김영갑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책은 수더분하다. 말을 스스로 아낀 예술가이기에 그런지 글의 내용이 주는 울림은 그다지 강하지 않다. 어쩌면 그동안의 나의 사유가 이런 글에 익숙하지 않았기에 그런지도 모른다. 책에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그의 결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사진을 들여다보고 다시 들여다보며 응시하다 보니 사진을 통해 그가 말하려던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 느낌을 가지고 글을 읽다보니 이제야 그의 글이 살아있는 것이 느껴진다. 채찍처럼 휘감겨 오는 강렬함은 아니지만 행간에 숨어있는 그의 열정과 진의가 조금씩 다가온다. 한 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 몇시간은 물론 몇날이고 기다려온 그의 모습처럼 나 역시 오랜 기다림 속에 내 자신을 바람속에 던져봐야 겠다.
'이발소에 두고 온 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세영외 지음 박상일 만듦, 『도시마, 스스로 제자된 자들이 만든 책 Toshima! 도시마』, 수연산방, 2009 (0) | 2010.04.06 |
|---|---|
| 시부사와 타츠히코지음, 문대찬 옮김, 『몸 쾌락 에로티시즘』인간은 왜 성에 탐닉하는가?, 바다출판사, 1999 (0) | 2010.04.03 |
| 양혜규, 『절대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 생성하는 멜랑콜리』, 현실문화연구, 2009 (0) | 2010.03.29 |
| 편혜영, 『재와 빨강』, 창작과비평사, 2010 (0) | 2010.03.26 |
| 신미식, 『마치 돌아오지 않을것처럼』, 끌레마 (0) | 2010.03.25 |